이 소설을 읽다가 마음 아프게 눈물이 맺힌 두세 번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연극 객석에서 검열로 삭제된 희곡 대본을 은숙이 불러내는 동안 그녀의 부릅 뜬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장면이다.
1980년 5월 18~28일 당시 은숙은 수피아여고 3학년, 동호는 중학교 3학년이었고, 도청으로 물밀듯이 실려오는 시민들의 주검을 수습하는 일을 도왔다. 은숙은 대학에 진학했지만 2년 만에 중퇴하고 소규모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게 된다. 그녀가 편집을 맡았던 희곡 대본이 전두환 군부의 검열 당국에 의해 삭제되고 난도질 당하지만, 원고를 거의 외우다시피한 은숙에게는 공연 중 삭제된 대사들이 배우들의 침묵과 신음이 섞인 입술 모양만으로도 되살아난다.
네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네가 방수 모포에 싸여 청소차에 실려간 뒤에.
용서할 수 없는 물줄기가 번쩍이며 분수대에서 뿜어져나온 뒤에.
어디서나 사원의 불빛이 타고 있었다.
봄에 피는 꽃들 속에, 눈송이들 속에.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 속에. 다 쓴 음료수 병에 꽂은 양초 불꽃들이.
검열에서 삭제된 희곡 대본 그대로일 수도 있지만, 은숙이 대본을 바탕으로 즉석에서 동호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다. ‘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는 그 사연과 표현에는 산 자의 시간 속에 죽은 자의 시간도 함께 흐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죽은이의 시간은 과거에 멈춰버리는 걸까? 어떤 이들에게는 그 죽음의 시간이 현재에 강렬하고 뚜렷하게 새겨져 같이 흐른다. 그래서 시간은 과거-현재-미래로 막힘 없이 흐를 수가 없다. 과거가 현재를 다시 그때로 끌고 가 흔들어놓고, 산 자의 삶은 다시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미래는 불안 속에 지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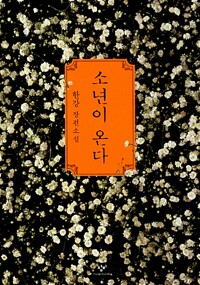
어린 시절에 가끔 생각하곤 했다.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아무것도 아닌 아득함으로 끝나고 만다면, 그건 너무한 것 아닐까?’ 그래서 나는 어떤 사후세계가 꼭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에는 ‘사람이 죽어서 아무것도 아닌 흙과 먼지가 되고 그걸로 끝나면 뭐 어떠냐?’ 하는 생각도 한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본다. ‘누가 죽어서 다른 세계에서 또 다른 인생을 누린다면 그에겐 천국이고, 정말로 죽고 나서 아무것도 아닌 흙과 먼지로 끝난다면 그게 곧 지옥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살아남은 은숙의 시간 속에 흐르는 동호의 시간은 비록 그것이 뜨거운 눈물로, 때로는 분노로 되살아날지라도, 죽음은 끝이 아닌 깊은 연결이고 위로의 출발점이고 부서진 삶이 재건으로 나아가는 지점이어야 할 것이다.
열여섯 살 동호는 집에 들어와 저녁 먹으라는 어머니의 호소를 뿌리치고 도청에 남았고, 그걸 은숙도 말리지 못한 채 나중에야, 계엄군이 들어온다는 그 시간에야 알아차리고 충격을 받았다. 왜 시민군들이 도청을 사수했는지에 대해 한강 작가는 증언자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게는 시민군이 도청에 남기로 선택한 이유를 절실하게 대변하는 증언으로 읽힌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군인들이 지급받은 탄환이 모두 팔십만발이었다는 것을. 그때 그 도시의 인구가 사십만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의 몸에 두발씩 죽음을 박아넣을 수 있는 탄환이 지급되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있었을 거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학생 대표의 말대로 우리가 총기를 도청 로비에 쌓아놓고 깨끗이 철수했다면, 그들은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눴을지도 모릅니다. 그 새벽 캄캄한 도청 계단을 따라 글자 그대로 콸콸 소리를 내며 흐르던 피가 떠오를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건 그들만의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들을 대신한 거였다고. 수천곱절의 죽음, 수천곱절의 피였다고.
방금 전까지 눈을 마주치며 대화했던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오는 피를 곁눈으로 보며, 누가 죽고 누가 남았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나는 복도에 머리를 박고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매직으로 내 등에 무엇인가 글씨를 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극렬분자, 총기 소지, 그렇게 썼다는 것을 상무대 유치장에서 다른 사람이 알려주었습니다.
작가는 에필로그에서 군인의 총검으로 가슴 한가운데가 찔리는 꿈 속에서 깨어난 순간 오분 가까이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고 쓴다. 오분간 숨을 못 쉬면 죽을 수도 있다. 작가에게 꿈을 통해 찾아오는 것은 죽은 이들의 시간이 산 자들의 삶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한다. 『채식주의자』에서도,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도 꿈이 주인공을, 작가를 위험한 곳으로 끌고 간다. 『소년이 온다』에 등장하는 이들의 목소리, 작가의 목소리는 독자인 나를 더 집중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