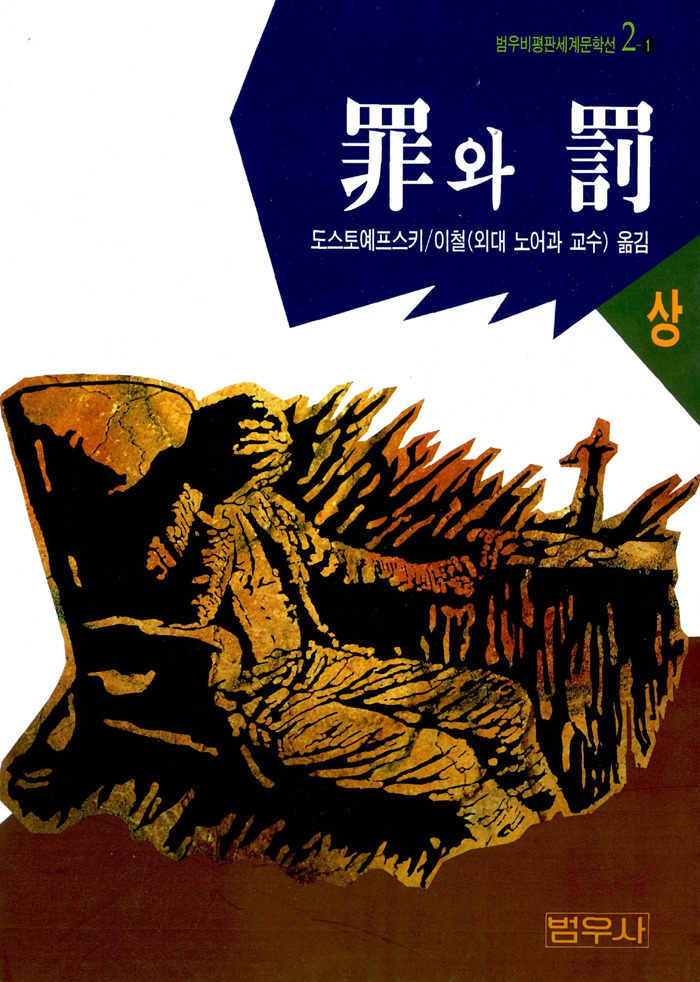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자기 확인’을 위해 겪어야 했던 고통이 소냐의 끝내 버림받지 않았던 삶에 대한 믿음으로 치유되는 결말은 감동적이다. 소냐는 불굴의 의지만으로 삶을 계획해 나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주정꾼 아버지, 페병과 분열된 자의식의 희생자인 어머니, 그 밑에서 가난과 슬픔에 짓눌려 살아가는 동생들을 위해 ‘황색 감찰’이 따라다니는 매춘부의 생활을 받아들여야 했다. 소냐에게 그 생활이란 자신의 믿음을 지탱해 나가는 가혹한 시험대였다.
죽은 나자로가 무덤에서 되살아나리라는 희망, 그것은 ‘모든 것이 허용된 비범한 인간’의 가능성을 향해 제1보를 내딛으려 한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소냐가 고통스럽게 들려준 대답이다. 부정의 부정을 통한 어떤 필연적 확신만이 신음하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요 그것이 곧 법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라스콜리니코프는 물리칠 수 없었다. 다른 인간사의 장면들은 모두 거기에 종속되어야 했다.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짜내는 고리대금업자인 전당포의 노파를 뭔가에 홀린 듯 살해했을 때, 라스콜리니코프는 바로 그 필연성의 핵심부로 들어간다. 그리고 노파가 죽자마자 현장에 나타난 선량한 리자베타마저 처참히 살해했을 때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핵심부의 컴컴한 심연 속으로 갇히고 만다. 그 심연 속에서 그를 둘러싼 세계는 공상과 현실의 복잡한 관계로 뒤엉키고, 라스콜리니코프 또한 그 혼란을 눌러놓아야만 했기에, 그와 다른 이들 사이에 진정한 화해는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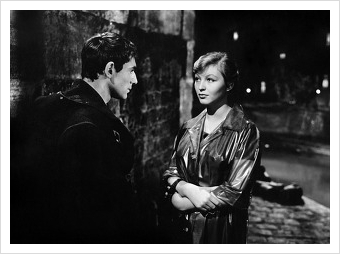
그럼에도 그에게 소냐만은 특별한 사람이었다. 어쩌면 소냐야말로 자신의 죄에 대해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는 최초이자 마지막 인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소냐는 피로 더럽혀진 대지에 입 맞추고 만인 앞에서 살인을 저질렀음을 알려야 한다고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말한다. 끊임없는 물음과 죄의 무게에 짓눌려 몹시 상해버린 몸으로 라스콜리니코프는 마침내 자수한다. 그리고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다른 죄수들의 ‘생활’을 목격하면서 바로 그 깊은 심연을 뚜렷하게 깨닫는다. 그것은 결코 건널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제한된 면회 규정 속에서도 감옥 창살 너머로 라스콜리니코프의 존재를 확인하고, 야외의 작업장에 날마다 들러주며, 다른 죄수와 그 친지들의 자질구레한 부탁까지도 도맡아 처리해주던 소냐가 몸살로 드러눕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심연을 건너게 해줄 다리가 소냐였음을 가슴 아프도록 깨닫는다. 화창한 햇볕 아래 드넓게 펼쳐진 푸른 초원을 바라보는 라스콜리니코프 곁에 어느새 소냐가 앉아 조심스레 손을 내민다. 로쟈(라스콜리니코프의 애칭)는 소냐의 무릎에 얼굴을 기대고 눈물을 흘린다. 소냐는 과거의 모든 천대와 가난과 모멸의 순간들을 겪어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여야 했다. 그것은 죽은 부모와 가엾은 동생들을 한때 돌보았으며, 지금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내맡긴 라스콜리니코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마침내 소냐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해본다.
그러나 그녀는 곧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의 눈은 그지없는 행복으로 빛났다. 그녀는 깨달았던 것이다. 그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지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마침내 그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이철 번역본, 범우사판).

도스토예프스키의 표현대로이다. 로쟈의 과거를 지배해온 ‘변증법을 대신해서 생활이 들어선 자리’에 죽은 나자로가 되살아난 것이다.
[2012.1.08]